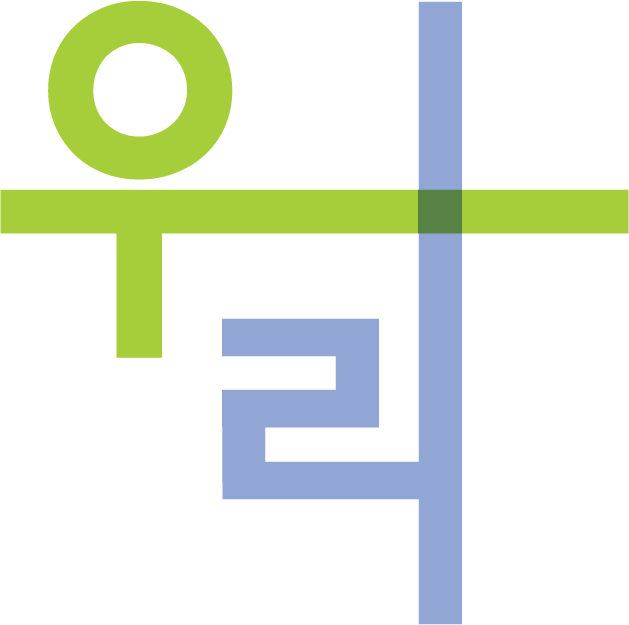연재글 왜 흔들리는가? (요나 4:6-9)
페이지 정보

본문
왜 흔들리는가?
조원태 목사의 '요나서로 묻는 17개 질문'
왜 흔들리는가? (요나 4:6-9)

"여호와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으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림자 위의 신음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었다. 감정의 수면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처럼, 기쁨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끝없는 파도를 맞았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네 가지를 준비하셨다 —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오늘 장면에 등장하는 세 가지는 모두 무언가를 덮거나 파괴하거나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박넝쿨은 말없이 자라 그의 머리를 감쌌고(욘 4:6), 벌레는 밤사이 줄기를 뚫었으며(욘 4:7), 해가 뜨자 동풍은 텐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숨을 끊을 듯 요나를 밀어붙였다(욘 4:8).
그늘 아래서 그는 잠깐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짧았다. 벌레가 남긴 상처만이 다음 날의 기억이 되었고, 해가 떠오르자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갈라진 입술을 다물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욘 4:8)
그때, 요나는 메마른 입술과 흐려진 시야 속에서 좌절과 분노가 엉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지 않았다. 고집은 여전히 그를 붙들었으나 그늘을 잃은 허무가 그의 가슴을 조여 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묻는다.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욘 4:9)
초막은 은신처가 아니라 고집의 구조물, 그늘은 은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 그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며, 어느 순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권리인 양, 그는 움켜쥐었다. 요나는 단호히 답한다.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욘 4:9)
그는 기뻐했고, 곧 분노했다. 다시 절망했고, 또 성냈다. 그의 감정은 길을 잃은 배처럼 흔들렸다. 흙탕물 위를 떠도는 나뭇잎처럼, 매번 같은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감정이 부딪히는 충돌의 기록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덕 위 텐트 속, 무릎을 꿇고 앉은 요나의 그림자는 오늘도 우리 곁에 있다.
그림자는 말이 없지만, 존재를 따라다닌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린다. 모닥불 하나 없이 앉은 요나의 실루엣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자존심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왔던가.
그림자 아래 앉아 있던 요나처럼, 우리도 종종 무너진 믿음 위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말없이 가까워진다. 박넝쿨이 되어 어깨를 덮고, 바람이 되어 가슴을 흔든다. 그분의 응답은 비켜간 적 없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용기가 시작된다고. 감정의 파동이 지나가는 자리에, 인간다움은 남는다고.[1] 수치심을 밀어낸 자리에서 진정성이 피어나고, 그 진정성은 다시 삶을 일으킨다. 흔들리는 마음속 깊은 곳, 그 말은 뿌리처럼 숨 쉬고 있다.
다음 날, 벌레가 줄기를 갉고, 동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그는 몰랐다. 흔들림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울림은 내면을 향해 번져간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방정식인지도 모른다. 요나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흔들리는 숨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자존심의 텐트 아래
회개한 니느웨를 멀리 두고, 요나는 자기 정당성을 곱십으며 초막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또 하나의 그늘을 더하셨다. 박넝쿨이다.
사람이 만든 그늘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늘이 덧입혀졌다. 초막이 자존심의 구조물이었다면, 박넝쿨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라낸 은유였다. 요나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늘의 시원함만을 기뻐했다.
하나님은 말없이 드리운 그늘로 요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셨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위에 하나님의 기척이 스며든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정의와 뜻을 움켜쥔 채 초막을 지었고, 그 안에 숨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 했다. 그 구조물은 안전한 은신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굳은 자존심으로 엮은 사이비 건축물이었다.
요나는 그 안에서 흔들렸다. 자기 손으로 만든 그늘 아래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며 버텼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셨다. 텐트는 흔들리고, 줄기는 갉아먹히고, 그의 세계는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 허물어짐은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박넝쿨도, 벌레도, 바람도 모두 하나의 대화였다. 요나를 다시 깨우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묻는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늘은 무엇인가. 나를 웃게 했던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은혜였으되, 내 것이라 여긴 모든 것—관계, 건강, 소명, 성취, 인정,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곁에 주어진 자리와 영향력.
그것이 사라지는 날,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요나가 앉았던 초막처럼, 나도 무언가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척, 사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온다. 변주된 물음으로—“그늘이 아닌,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요나는 여전히 자기 그림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그늘을 준비하고 계셨다. 박넝쿨이 시들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욘 4:9)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흔든다. 요나의 텐트를 넘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신다.
흔들림 속의 거룩한 철거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시들게 하신다. 그늘은 사라지고, 동풍이 불기 시작한다.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요나는 다시 분노한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한다. 박넝쿨 하나로 인해 기뻐했던 그가, 이제 그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한 도시의 생명에는 냉담했으면서, 자기에게 드리워졌던 작은 그늘 하나의 소멸에는 절망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묻는다. “네가 그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욘 4:9)
그 질문은 단지 식물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요나의 전 생애를 향한 물음이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는 니느웨의 구원 앞에서는 성을 내고, 자신의 그늘 앞에서는 기뻐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랐고, 자기에게만 유효하기를 원했다.
편협한 구원관, 오만한 정의감, 굳어진 선민의식. 그것이 요나를 흔들리게 만든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통해 요나를 흔드신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심판이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자비는 텐트 바깥에서부터 요동쳤고, 그것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팀 켈러의 통찰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했으며, 은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높이 둔 결과였다.[2]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흔들며 물으신다. “너는 왜 그렇게 성내는가?”(욘 4:9)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흔든다. 요나의 텐트를 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분은 요나가 흔들리지 않도록, 흔드시기 시작하셨다. 박넝쿨은 그를 위한 새로운 거울이었다. 그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의 내면을 비추는 연둣빛 언어였다.
루터는 이를 "하나님의 낯선 사역"(opus alienum)이라 불렀다. 심판과 고난 같은 낯선 도구로 하나님은 은밀히 은혜를 이끄신다.[3] 박넝쿨은 그런 하나님의 은유였다.
그 거룩한 철거와 대체의 작업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무너진 기대를 품고 혼자 초막을 짓지는 않았는가. 사라진 그늘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성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을 웃게 했던 그 사람, 그 일, 그 자리를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여긴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까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기억하라.
그늘이 사라진 그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셨다. 텐트 바깥에서, 뜨거운 바람 속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셨다. 그분은 무너지게 하셨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욱 흔들릴 수 있었다.
브루그만은 예언자의 흔들림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긴장 속에서 생기는 필연적 역설이었다고 했다.[4] 요나의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이끄시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헤셸은 예언자의 길이 곧 하나님의 감정에 참여하는 여정이라 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저항이 충돌하는 곳, 바로 그 경계선에 요나는 서 있었다.[5]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초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 과정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진행 중이다. 박넝쿨은 결국, 요나가 자신의 운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시에 그것은, 요나가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였다.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진정으로 운명을 맡기는 길이다.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이비 건축들, 이제는 그 모두가 은혜로 대체되기를. 그 철거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움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사탄의 질문, 요나의 시험
박넝쿨은 시들고, 해는 머리를 내리쬐었다. 요나는 정신이 아득해져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늘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요나의 심정이 이해된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멀쩡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기대했던 응답 대신 정적만이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던 박넝쿨마저 사라졌다.
그 순간, 요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 앞에 놓였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자유를 주셨지만, 뱀은 한 구절을 비틀어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뱀은 속삭였다.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창 3:1)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창 2:16–17). 그러나 사탄은 그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사람을 흔든다. 단 하나의 단어, "모든"이라는 과장이 진실을 왜곡했고, 단 하나의 시선 왜곡이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요나는 지금 그 시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의심한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선한 것이 맞는가? 그의 믿음은 박넝쿨 하나에 매달려 흔들렸다.
우리도 그렇다. 단 하나의 기쁨, 단 하나의 응답이 사라졌을 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잠시의 그늘에 마음을 걸면, 영원의 빛이 가려진다. 지금의 고통과 결핍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 더 깊고 오래된 것을 잃는다. 단지 하나가 꺼졌을 뿐인데, 모든 등이 꺼졌다고 여기는 마음. 미니멀(minimal)이 무너졌을 뿐인데, 맥시멀(maximal)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요나의 모습이다. 우리도 그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진짜 중요한 것—맥시멀—이 미니멀을 덮고 지켜야 한다. 삶의 핵심가치가 요나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열정도, 목적도 다 사라진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은 결코 우리 존재의 전부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요나는 묻는다. 지금까지 지나온 풍랑, 물고기 뱃속, 회개의 외침,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는가? 니느웨의 구원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는가? 단 하나의 박넝쿨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요나를 드러내신다. 그 내면을 비추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붙든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신다.
박넝쿨의 MRI: 집착의 해부
요나는 왜 그토록 박넝쿨에 흔들렸을까. 그것은 단지 그늘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겼다.
히브리어로는 '키카욘'(qîqāyôn, קִיקָיוֹן)—아주까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식물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다.[6]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무는 단 하룻밤 사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늘은 무너진 요나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이었다. 도시를 떠나 텐트를 치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던 요나에게, 그늘은 뜻밖의 자리에서 자라났다. 말없이 그의 어깨를 덮은 그 그늘은 마치 아버지 곁을 평생 지켰던 맏아들에게 드리운 권위의 그림자처럼(눅 15:28–30), 마음을 풀게 했다. 요나는 안도했고, 곧 그 안도에 집착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셨다.
밤사이 벌레가 줄기를 갉았고, 해가 뜨자 그늘은 사라졌다. 요나는 분노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늘이었다. 그의 순종과 정의, 신념과 선민의식은 그늘 아래에서만 유효했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는 무너졌다. 마치 ‘자기 의’를 훈장처럼 단 맏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분노하듯(눅 15:28–30).
박넝쿨은 하나님의 MRI였다. 연조직을 비추듯, 그의 감춰진 심령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족주의, 자기 의,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늘은 그가 숨었던 마지막 피난처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철거하신 마지막 구조물이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을 붙들려 했듯, 요나도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은혜는 흐른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끝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고정된 상징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그늘에 안도하고, 그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늘을 거두신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때 들려오는 물음 하나—“너는 언제, 그늘보다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그 고백이야말로 요나의 내면을 비추는 엑스레이에서 얻은 유일한 진단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앞서 박넝쿨의 MRI처럼 내 집착을 해부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자연스레 내 삶 속 흔들림이 겹쳐졌다. 요나의 흔들림과 다르지 않은, 그러나 은혜로 이어진 기억이었다.
요나서 전체를 따라가는 내내, 나를 흔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다시 부르셨고,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말하셨다.
2000년 가을이었다. 유학의 꿈으로 모은 오백만 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은 가장 큰 돈이었다. 사임을 결심하고 교회에 발표한 어느 날, 인도의 달릿을 섬기는 한 여성 선교사가 교회를 찾아왔다.
“오백만 원이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의 저울이 기울었다. 나는 통장을 내어주었다. 사임은 발표했지만, 유학길은 닫혔다. 그 순간은 내게도 흔들림이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도제목과 계좌번호를 적어 코팅한 작은 꿈을 담은 카드 하나를 만들고, 봉고차를 타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달간 마을과 교회를 무작정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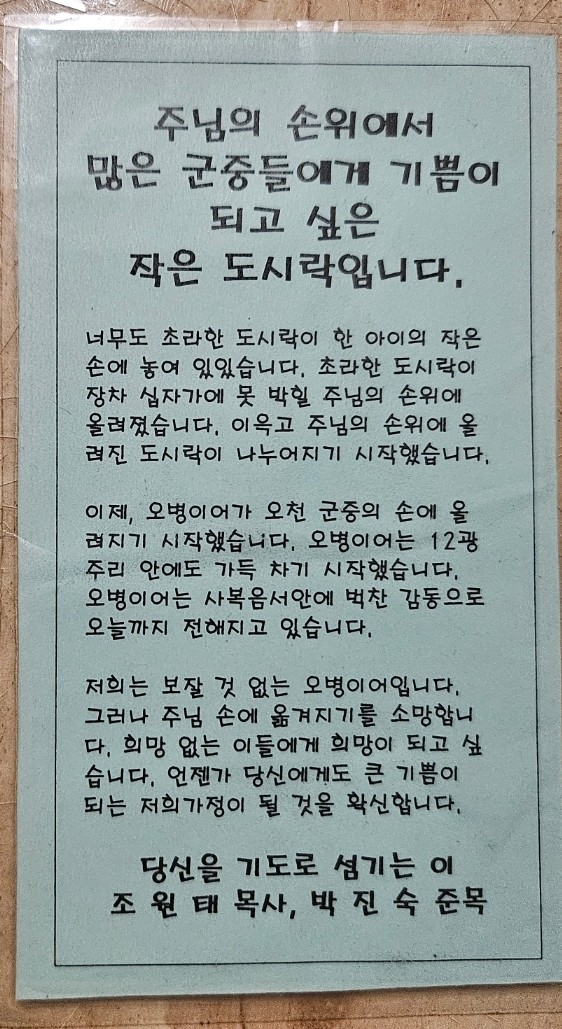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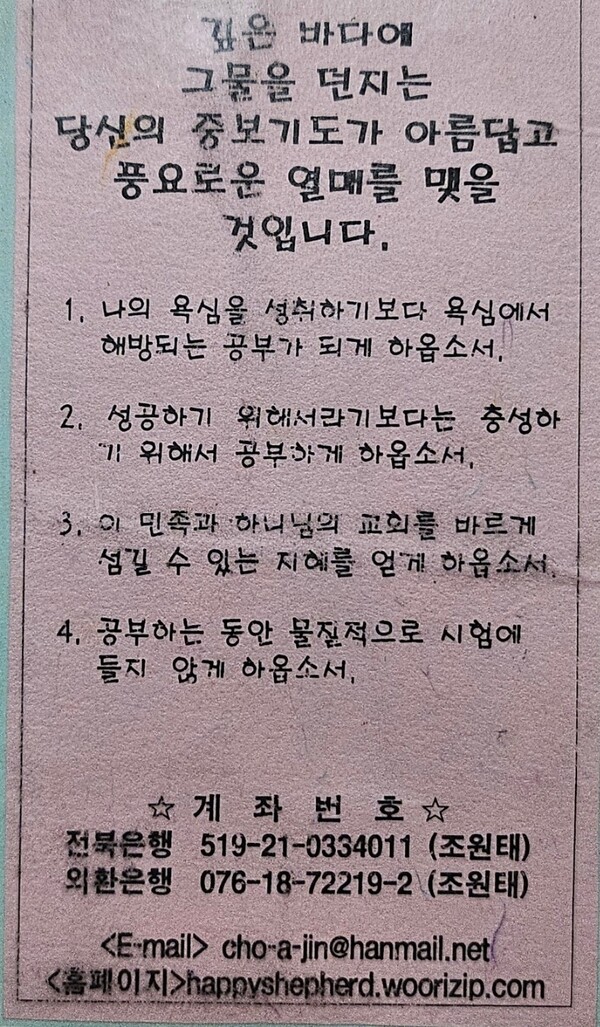
꿈을 담은 카드를 내어 보이며, 제 꿈을 신뢰할 수 있다면 딱 2년만 매달 2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골 마을에서도, 바닷가 교회에서도 주름진 손들이 쌈짓돈을 내어주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을 통해 다시 붙들렸다.
그 돈으로 2001년 1월 29일, 나는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환전한 돈은 24만 원. 그러나 내 가방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내 흔들림조차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흔들림 속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를 믿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뢰소리같은 진리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회복 가능성을 신뢰하시며, 믿음을 거두지 않으신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믿고 계셨다.[7]
그의 도망을 알면서도, 그의 분노를 보면서도, 그의 침묵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으셨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세우셨다.
요나에게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다. 설득되지 않아도 기다리셨고, 기다리면서도 사랑하셨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지치지 않으시고, 좌절도 모르시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요나가 “말을 바꾸신 것 아니냐”고 항의해도, 하나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한결같은 자리에서, 그의 눈으로 요나를 바라보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꺼낸 요나를 향해 다시 들려주셨던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요나 3:2).
그 말씀은 1장 2절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았다. 같은 문장, 같은 뜻, 같은 사랑이었다.
요나의 세상은 풍랑과 외면과 그늘과 분노로 요동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일이 지나가도 그 뜻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삶의 굴곡을 건널 때마다, 말씀은 닻이 되어 그를 붙들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흔들림은 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니느웨로 가라.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부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그친 자리에 남은 그 음성 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돌려준다. 미세한 진동처럼.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끝내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무너짐 뒤에 시작되는 부르심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하나의 그늘이 걷히면 마음도 함께 꺼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면 분노부터 솟구친다. 요나가 그랬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거두셨다. 인간이 움켜쥔 은신처를 걷어내고, 다시 자비를 가르치셨다. 그것은 무너뜨리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초대였다. 다시 도시로, 다시 사람들 속으로, 다시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믿음의 손짓이었다.
요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물음을 품었다. “나는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요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물음이기도 하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말없이 다가오는 바람, 텐트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정적,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다. 믿음은 고요한 날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지고, 햇빛이 직면하고, 그늘이 사라진 오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숨 쉴 틈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은 떠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 흔들림의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음성— “너는 언제, 그늘보다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그 음성은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였고, 우리는 그제야 텐트를 걷고 다시 도시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떠나온 그곳,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그늘의 끝에서
조원태
한 점 그늘이 그리워
숨죽이며 걷던 황무지 위에
주께서 연둣빛 박넝쿨을
내 머리 위에 드리우셨다
그 잎은 넉넉했고
그 그늘은 내 상한 마음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나는 그것을 은혜라 믿었고
곧 내 것이라 여겼다
하루가 지나자
그늘은 내 안식이 되었고
이틀이 지나자
그늘은 내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셋째 날,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뿌리를 건드리시니
박넝쿨은 시들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잎 아래에서
속으로 울었다
“왜 거두시나이까”
그때 들려온 한 음성 —
“너는 언제,
그늘보다 나를 사랑하였느냐”
나는 무릎 꿇고
박넝쿨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잎사귀 하나 없는 벌거벗은 자리,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다시 찾으셨다
말씀 없이 품으셨고
나는 기도 없이 눈물 흘렸다
“그늘도 내 것이요
그늘을 거두는 것도
내 사랑이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박넝쿨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되
결코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진정한 그늘은
그분의 그림자 아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늘의 끝에서
각주) [1] Brené Brown, The Gifts of Imperfection (Center City: Hazelden, 2010), p. 55.
[2] Tim Keller, The Prodigal Prophet: Jonah and the Mystery of God's Mercy (New York: Viking, 2018), p. 137.
[3]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Luther’s Works, Vol. 3), ed. Jaroslav Pelikan (St. Louis: Concordia, 1958), pp. 21–22. —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통한 역사 방식을 opus alienum 즉 ‘낯선 사역’이라 불렀다. 이는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 은밀히 선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4] Walter Brueggemann, A Prophet to the Nations: Jeremiah (St. Louis: Chalice Press, 2001), p. 27.
[5] Abraham Joshua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pp. 80–81. — Heschel은 이 부분에서 예언자를 '하나님의 pathos(감정)에 깊이 참여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연민을 함께 느끼며, 그것을 자기 존재에 새기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6] 키카욘(qîqāyôn, קִיקָיוֹן):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식물.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박넝쿨’ 혹은 ‘아주까리’로 번역되나, 정확한 학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히브리어 원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7] Jonathan Sacks, Judaism’s Life-Changing Ideas (New York: Maggid Books, 2020), pp. 3–8. 색스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신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고 동반자로 부르셨다는 통찰이다.
- 이전글왜 아끼는가? (요나 4:10-11) 25.09.18
- 다음글왜 기대하지 않는가? (4:5b) 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