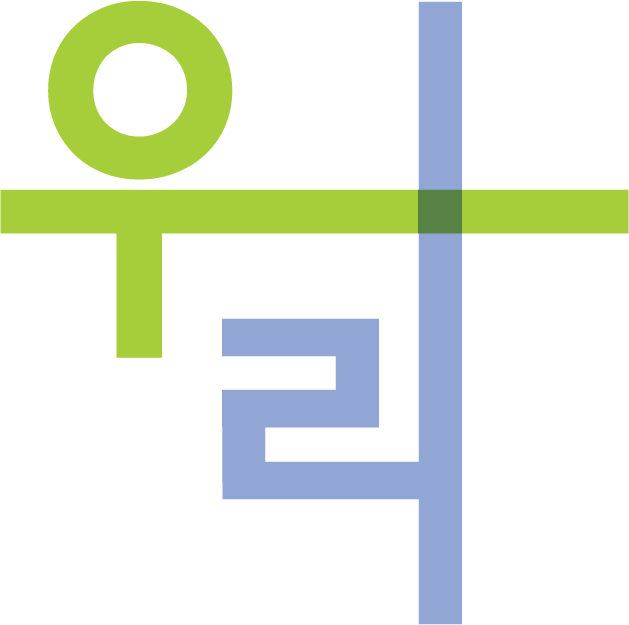연재글 왜 구경만 하는가? (요나 4:5)
페이지 정보

본문
조원태 목사의 '요나서로 묻는 17개 질문'
왜 구경만 하는가? (요나 4: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결혼한 직후, 집이 없었다. 가난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 시절, 새벽 기도 중 한 할머니가 다가와 오래 비어 있던 집이 있다며 원하느냐고 물었다. 군산 외곽, 회현이라는 동네였다.

수십 년 빈집, 기울고 허물어진 집이었지만 내겐 선물이었다.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고, 화장실을 팠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과 다시 찾은 그 집은, 30년 전의 허름함 그대로였다. 벽과 지붕이 기운 그곳. 살아보겠다던 나를 떠올렸다.
그 집은 삶의 경계에서 맞이한 첫 초막이었다. 바람을 막고 몸을 눕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서야 할 자리와 마주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요나의 초막처럼, 그것은 물러서기 위한 벽이 될 수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집은 내 의로움이 그늘이 될 수도 있었고, 상처를 품고 누운 분노의 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 가해자들이 사는 도시 안으로 나를 늘 이끌었다.
도시를 등진 예언자, 그늘 속의 방관자
하나님이 물으셨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처럼 굳은 침묵이 목을 막았다. 그는 도시의 심장부를 등지고 바깥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길이었다.
니느웨의 중심은 아직 식지 않았다. 회개의 눈물로 젖은 흙, 용서를 받아 살아난 아이들의 숨결, 무너진 담장 위로 맴도는 울음과 찬송이 도시의 공기 속에 뜨겁게 퍼져 있었다.
요나는 그 뜨거운 숨결을 등졌다. 멀리, 바람 한 점 없는 동편으로 걸었다. 말없이, 표정 없이, 마른 가지를 주워 어깨에 걸치고, 땀이 번진 손으로 초막을 엮었다. 틈을 메우고, 그늘을 만들고, 아무도 없는 그 속에 몸을 웅크렸다.
초막은 작았다. 바람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그곳에서 요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바깥에서 보기로 했다. 심판이 올지, 오지 않을지. 스스로 구경꾼이 되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회개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고, 그 땅에 스며든 눈물과 자비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는 멀찍이 바라보고자 했다. 초막 그늘 속에서, 그는 온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리에서 세상을 지켜보았다.
요나서 4장 5절에는 ‘도시(city)’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 앞에 붙은 전치사는 모두 다르다. 그는 도시 from — 도시로부터 걸어 나왔다. 동편 at — 도시 곁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도시를 to — 바라보았다.
이 세 전치사는 요나가 만든 심리적 거리, 스스로 세운 회피의 구조다. 도시를 등지고, 곁에 머물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 몸은 도시 밖에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요나는 도시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떠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일이었다. 떠나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경계에서 멈췄다. 도시의 숨결은 여전히 그의 등 뒤를 스쳤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외면한 그곳 안에서 피어났다.
그는 마른 가지로 시야를 가리고, 감정을 덮고, 마음을 눕힐 그늘을 만들었다. 초막은 하나님의 마음을 피하는 벽이었고, 그늘은 질문을 막는 뚜껑이었다. 그는 끝내 구경하기로 했다. 구경은 개입하지 않음이며, 개입하지 않음은 사랑하지 않음이다.
요나는 왜 구경만 하는가. 이 글은 그 물음에서 시작된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야 할 누룩
요나는 도시의 문을 지나 동쪽에 앉았다.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생긴 틈, 그 거리를 확인하는 발걸음이었다.
성서에서 동쪽은 심판의 기점이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자리(창 3:24),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신 자리(눅 19:41). 지금도 예루살렘 동문, 즉 황금문을 향한 언덕에는 유대인의 무덤이 빽빽하다. 그들은 메시야가 오는 날, 그 문을 통과해 다시 일어나리라 믿는다(슥 14:4).[1]
요나는 이 상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언자의 눈으로 그곳에 앉아 심판을 기다렸다. 그러나 심판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도시 안으로 보내셨지만, 그는 등을 돌려 초막을 지었다. 심판을 바라는 그의 마음과 자비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긋난 자리였다.
요나가 앉은 동편은 심판을 바라보는 자리였다. 남의 심판을 지켜보는 시선에는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깃든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요나의 자리는 도시 안이었다. 그는 니느웨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눅 13:21). 반죽 밖의 누룩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빵을 만들 수 없다. 도시 안에 들어가지 않은 요나는, 밀가루 밖에 굳어버린 누룩이었다.
교회도 그렇다. 고난받는 역사 밖에 머무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소통을 잃는다.[2]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말했다. “나를 가장 크게 실망시키고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침묵한 내부의 친구들이었다.”[3] 그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동편에 앉아 다른 이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은, 본질을 잃은 신앙이다. 마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던 큰형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탈한 믿음이다.[4]
밖은 편하다. 덜 부딪히고, 덜 아프다. 그러나 그 편안한 거리는 때로 치명적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안으로 부르셨다. 누룩을 반죽 안에 넣으셨다.
우리도 역사와 아픔, 회개의 자리 한가운데에 서야 한다. 보냄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기만의 초막, 가인이 되어가는 마음
요나는 동편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지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에서 멈추는 곳마다 세웠던 그 초막을, 그는 이번엔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기 힘으로 홀로 세웠다.
그 자리는 은혜의 머무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망루였다. 그늘 아래 몸을 움츠린 채, 그는 니느웨의 멸망 장면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려냈다. 초막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창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창문이었다.
초막(히. 숙카, סֻכָּה)은 본래 피난처이자 임시 거처를 뜻한다. 그러나 요나의 숙카는 자비가 머무는 장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눕히는 방, 미움을 쌓아 올린 집이었다.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벽 없는 요새를 지었다.
그 마음은 가인을 닮아갔다. 가인이 동생의 제사를 시기했듯, 요나는 니느웨가 받은 자비를 시기했다. 창세기 4장 6절과 요나서 4장 4절의 질문 —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냐?”(히. 라마 하라 라크, לָמָּה חָרָה לָךְ) — 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울림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 같은 심장을 깊이 찔렀다.[5]
이 질문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호소였다. 왜 그토록 분노하느냐고, 그 분노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였다. 요나는 그 목소리 앞에서 돌처럼 굳었고, 그의 초막은 그 굳음을 가리는 가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마 5:22).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지만, 그 자비가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자신이 받은 자비는 합당했고, 다른 이가 받은 자비는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의 초막은 칼 없는 살인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미움은 칼날 없이도 생명을 해친다. 요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도 미움을 품는다. 그러나 그 미움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래 두면 마음의 벽은 두꺼워지고 창은 좁아진다. 숨결이 스미지 못하고, 빛이 닿지 않는 방이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심판만 기다리며, 자비의 문을 스스로 잠근다.
심판을 기다리는 초막이 아니라, 자비를 사는 초막을 지어야 한다. 허물어질 만큼 가볍고, 언제든 떠날 수 있을 만큼 단출한 곳. 그 안에서는 원수를 위한 기도가 피어나고, 상처 입은 이를 위한 자리가 생겨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헬라어 ‘스케노오’(σκηνόω)는 ‘초막을 짓다’라는 뜻이다. 잠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뿌리내리는 집을 세운다는 말이다. 예수는 그 장막을 우리 안에 세우셨다.[6] 그분의 초막은 담이 아니라, 열린 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세상 속에 자비의 거처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 거처에서 우리는 미움 대신 용서를, 심판 대신 화해를 택한다.
구경꾼의 자리, 침투하는 사랑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동편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지은 뒤, 그늘 속에 몸을 눕혔다. 손은 멈추었고, 남은 건 한 가지—도시의 멸망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무너지는 성, 불처럼 번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고립됐다. 하나님의 숨결은 니느웨 안에서, 회개의 눈물 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요나는 그 자리를 등지고, 제3자의 시선으로 거리를 두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눈은 마음을 비운다. 비극을 먼 풍경으로 만들며, 스스로 옳다는 착각을 키운다. 하나님의 일 한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바깥에서 감시하듯 지켜본다.
그렇게 요나는 구경꾼이 되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은 단단했지만, 그의 발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밖에 있었다.
그것이 구경꾼의 비애다. 하나님은 도시 안에서 일하시는데, 요나는 스스로 만든 소외 속에 앉아 있었다. 동편의 초막은 실제로 외롭고, 그 구경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구경꾼이 있었다.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고, 대제사장들도 비웃었다(막 15:29). 그들은 다만 구경만 했다.
그러나 사랑은 구경하지 않는다. 사랑은 반드시 들어간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는 도시의 방파제가 되었고, 심판을 막으려는 사랑의 성벽이 되었다. 그는 도시 밖이 아니라, 그 심장부로 향했다.[7]
예수님도 그러셨다. 감람산 동편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셨다. 빌립보서 2장은 기록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경꾼의 초막은 회피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입의 자리다. 그 사랑의 침투가 곧 성탄이다.[8]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셨다. 우리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혹시 지금, 요나처럼 멀찍이 앉아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초막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비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곳은 안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밀가루 속에서만 산다. 그분의 사람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어깨에 짊어진다. 가인처럼, 요나처럼 미움의 벽을 세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무너져가는 도시 앞에서 사랑으로 심판을 막아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초막을 세운다. 함께 머무르며.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이웃의 상처 속으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사랑의 초막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으로 침투하는 사람들이다.
경계 너머
조원태
바람이 불어왔다
아무도 닿지 않는 경계에서
나는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한 그림자가 경계를 넘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그의 숨결은 나의 허공을 채웠다
그는 말없이 내 안에 앉아
작은 빛을 심었다
그 빛이 자라, 내 방을 열고
세상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
각주) [1] 감람산 동편 무덤에 대한 전통은 유대교 메시아 신앙과 결합되어 예루살렘 동문을 향한 종말론적 기대를 상징한다. 참고: Karen Armstrong, Jerusalem: One City, Three Faiths (Ballantine, 1997).
[2]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신홍섭 옮김, 복있는사람, 2004)는 제자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박해남 옮김, 간디서원, 2005)는 정의와 사랑을 외면한 교회의 침묵을 가장 큰 실수로 지적한다.
[3]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박해남 옮김 (서울: 간디서원, 2005), 76쪽.
[4]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위치 변화는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와 신앙적 거리 두기를 상징한다. 필립스 트리블은 이를 "자비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이라 해석한다. See: Phyllis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Fortress, 1994), 205–207.
[5] 창세기 4:6과 요나서 4:4의 히브리어 본문은 거의 동일하며,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 분노하는 인간의 마음을 비춘다. 이를 근거로 요나는 점차 '가인화'되어 가는 인물로 해석된다. 참고: Jack M. Sasson,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294–298.
[6] 요 1:14의 "거하다"는 헬라어 '스케노오(σκηνόω)'로, 직역하면 '초막을 짓다'는 뜻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자비의 거처를 인간 가운데 세우는 사건임을 상징한다. Cf. Eugene H. Peterson, 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Colorado Springs: NavPress, 2002)
[7] 아브라함의 중재 행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도시를 향한 사랑의 개입이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방패였다. 이에 대해 레너드 스위들러는 아브라함을 “신적 자비를 요청하는 최초의 중보자”로 칭한다. See: Leonard Swidler, Biblical Dialogues (Paulist Press, 1984).
[8]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후 십자가를 향해 걸으신 경로는 '구경꾼 요나'와 상반된다.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며, 그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다. Cf. N.T. Wright, The Challenge of Jesus (IVP, 1999)
- 이전글왜 기대하지 않는가? (4:5b) 25.09.16
- 다음글왜 성내는가 (요나 4:4) 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