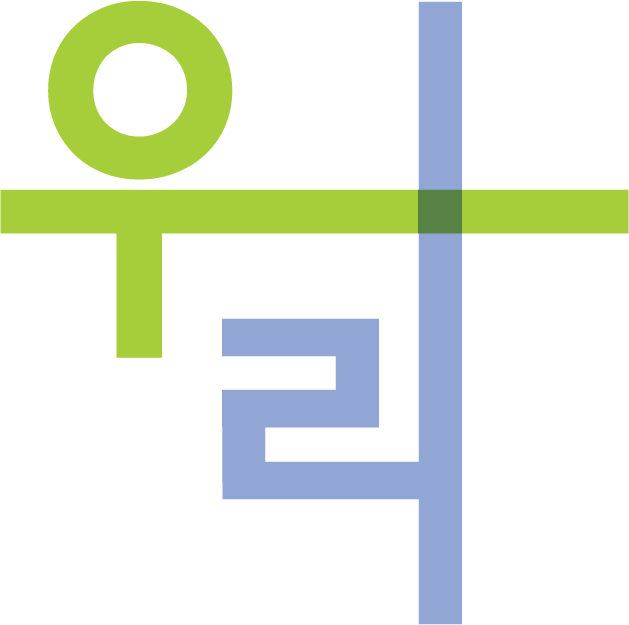연재글 왜 나는 정당해야만 하나? (요나 4:2-3)
페이지 정보

본문
조원태 목사의 '요나서로 묻는 17개 질문'
왜 나는 정당해야만 하나? (요나 4:2-3)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욘 4:2-3)
억울함이 부른 기도
요나는 기도했다. 그러나 그 말은 기도가 아니었다. 속 깊이 눌러 둔 억울함이 문을 열고 나왔다. 꾹 삼키다 터진 분노, 기도인지 변명인지 모를 어정쩡한 숨소리.
“나는 애초에 알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오래 응고된 억울함이 덩어리째 굴러 나왔다. 그는 여호와 앞에 고백 아닌 고발을 늘어놓았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욘 4:2)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결국 자비를 베푸실 것을 이미 알았다는 자기 확신과, 그래서 자신의 도망이 정당했다는 은근한 비난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옳았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니느웨의 회개보다 자신의 판단이 무너진 것이 더 괴로웠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정의의 담장을 무너뜨렸다. 폐허 위에서 그는 묻는다. “내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옳았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달랐다.
그때는 바닥에 무너진 자의 부르짖음이었다. 지금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가 쓴 가면이었다. “나는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에는, 자비보다 자신을 알아달라는 속울음이 배어 있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에 더 크게 무너진다.
요나는 지금 그 어둠 속에 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애써 무너지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 요나의 그림자 속에서 나를 본다.
내게도 억울함은 스며든다. 말끝에서 미끄러진 진심, 닿지 못한 마음, 눈앞에서 흐릿해진 의도들. 그런 날이면 나는 스스로 누추해진다. 변명은 어설프고, 서운함마저 촌스럽다.
그렇게 나는 요나가 된다.
자비 앞에서도 억울함이 먼저 고개를 든다. 속이 먼저 울컥 끓어올라,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더 옳은 척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요나의 그림자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낡은 흙벽 뒤에 숨듯 상처를 방패 삼아 웅크린다. 눈빛은 매섭게 빛나지만 속은 흔들리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정말 이게 옳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왜 나는 끝까지 옳아야만 하는가?
자기 정당화는 분노를 달래는 서툰 방법이었다. 눈앞의 현실이 거슬렸고, 그 불편을 견디지 못해 나는 스스로를 방어했다. 그것은 상처를 가리려 두른 얇은 외투 같았다. 요나도 그랬다. 그는 기어이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했다.
레온 페스팅거는 이 마음을 '인지 부조화'라 불렀다.[1] 신념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칠 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서늘한 진동. 사람은 그 틈을 메우려, 흙으로 새겨진 균열을 손으로 문지르듯, 애써 자기를 정당화한다.
요나도 그랬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에게 포근한 빛이 아니라 눈부시게 아픈 햇살이었다. 너무 크고, 너무 깊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다. 입술은 날카롭게 갈렸고, 말은 실처럼 풀려 나와 논리의 매듭으로 엮였다. 그러나 그 매듭은 결국 하나님께 되돌려진 비난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정당함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그는 끝까지 옳고 싶었다. 그 옳음이 무너지는 순간, 자존도 함께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 붕괴는 죽음보다 두려웠다.
그러나 요나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니느웨는 그의 한 마디에 무너졌지만, 그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여호와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욘 4:3)라 고백하던 그의 입술은, 막상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일 앞에서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흩어진 판단과 자존심의 잔해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때는 제단이었으나 이제는 방치된 성전처럼. 한때는 불타오르던 신념이었으나 이제는 그을려 식어버린 돌덩이처럼.
자비의 빛은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그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사랑은 그의 어깨를 흔들었으나, 그는 몸을 웅크린 채 깨어나지 않았다.
말씀으로 자비를 겨누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다.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재판대에 세웠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의 언약 —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는 이 은혜의 언어를 꺼내 자비를 반박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욘 4:2).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구절은 자비를 붙드는 손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자비가 틀렸다고 선언하는 칼날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문장을, 하나님을 향한 기소문의 첫 줄로 바꿔 놓았다.[2]
켈러는 말한다.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더 의롭다고 느낀다면, 이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3]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지 않음을 드러낼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비로소 바르게 읽힌다.
성경을 자기방어와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와 영혼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 —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경계에 서는 순간이다.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중세 종교재판(마 18:17; 롬 13:4 오용), 유럽 마녀사냥의 폭력 현장(출 22:18 남용),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옹호 설교(신 32:8; 행 17:26 왜곡),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한 미국 남부 강단(골 3:22; 엡 6:5 오용), 전쟁과 십자군 원정을 정당화한 강단(신 20:16-18; 시 144:1 남용),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화 설교(수 1:3-5; 롬 13:1-2 오용),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 설교(롬 13:1 왜곡), 르완다 학살 당시 폭력 선동(잠 28:1 오용),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의 반대세력 탄압(벧전 2:13-14 남용), 미국의 원주민 강제이주 ‘눈물의 길’ 정책(신 7:2; 롬 13:1 오용),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탄압(롬 13:1-2 왜곡), 남태평양 식민지 선교의 강제동화(마 28:19-20 남용), 필리핀 식민통치기 스페인 제국주의의 원주민 동화(마 28:19-20 왜곡), 인도 카스트 제도 옹호 설교(고전 7:20-21 오용), 호주 원주민 아동 강제격리 정책 설교(롬 13:1 남용), 뉴질랜드 마오리족 토지 강탈 설교(수 1:3-5 왜곡), 미국 원주민 선교 명목의 토지 수탈(신 7:1-2 남용), 아일랜드 대기근 시기 식민지 통치 옹호 설교(롬 13:1 왜곡), 미국 원주민 말살을 정당화한 강단(시 2:8 남용),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침묵한 설교(엡 5:22 왜곡)[4].
그들은 모두 성경을 들었지만, 그 성경은 사랑의 강이 아니라 억압의 칼이 되어 있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감싸고 타인을 찌를 때, 성경은 더는 거울이 아니라 칼이 된다. 그 칼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옳아 보이기 위해 성경을 붙드는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실 위에 서려면 본문이 전하는 뜻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모자라다.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맞추는 길은, 아무리 치밀한 신학 논증을 쌓아 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표지판이 되고 불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구든 말씀을 손 안에 무기처럼 움켜쥐고, 필요할 때 꺼내어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잘못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본래의 자리에서 뜯어내어 부서뜨리는 역사가의 손길,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떠받치려 본문을 끌어다 쓰는 신학자의 손길, 혹은 다른 믿음을 지닌 이웃을 향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성경을 펼치는 그리스도인의 손길—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5]
요나의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써 내려간 고발문의 첫 줄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원으로 감싸듯 맴돌았고, 문장마다 ‘나’와 ‘내’가 녹슨 못처럼 박혀 있었다.
그가 움켜쥔 출애굽기 34장 6절은 본래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앞부분만이 울렸다. 죄인을 벌하신다는 후반부는 사라졌다. 은혜의 문장은 그의 손에서 서서히 분노의 칼날로 바뀌었고, 사랑의 강물이어야 할 말씀은 차갑게 굳어 자기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었다.
그 순간 대화는 부드러운 기도가 아니라 날 선 논쟁으로 기울었다. 구원은 감사의 노래에서 벗어나, 말과 말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정의를 움켜쥐었고, 그 정의가 지켜낸 것은 굳게 닫힌 마음과 상처 난 자아뿐이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그랬다. "기록되었으되." 그 짧은 선언 하나로, 마귀는 시편 91편을 끌어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르라며, 말씀을 방패가 아닌 덫으로 바꿨다. 진리는 사랑을 잃은 채 차가운 칼끝만 남았다.
요나도 그랬다. 자비가 정의를 흐린다고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맞섰다. 그 순간 그는 회개한 예언자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 변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가 되는가. 내 논리를 지탱하려 성경을 펼치고, 내 입장이 옳다고 우기며 구절을 맞춰 끼울 때.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비추는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내가 쥐고 휘두르는 거친 횃불이 될 때.
그러나 성경의 심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본래 의롭지 않다.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길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근거도, 다른 이를 정죄하며 옳다고 주장할 권리도 없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뿐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읽는 자리이자,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성경은 나를 변호하려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의롭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정당하게 한다. 그 사랑은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우리는 그 앞에서야 비로소 모든 말을 내려놓는다.
'이럴 줄 알았어' — 자기연민의 안식처
요나는 말했다. "이럴 줄 알았다." — "내가 알았음이니이다"(욘 4:2)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다. 그 말에는 희생의 서사, 허무의 그림자, 땀으로 얼룩진 순종의 기록이 얽혀 있었다.
“나는 애초에 알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자기 감정을 향한 피로였다. 요나는 이해받고 싶었다. 감정의 무게만큼 인정받고 싶었다. 결과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자신은 왜 이 길을 택했던가. 그는 속으로 웅크렸을 것이다. “괜히 왔어. 이럴 줄 알았어.”
심리학은 이를 ‘예측적 정서반응’이라 부른다.[6] 원하는 결말이 무너질 때,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한다. 실제로는 몰랐더라도, 그 말은 부서진 자존을 붙드는 방패가 된다.
요나의 말은 억울함의 언어이자 분노의 외투였다. 진실에 다가가기보다 회피에 기댔고, 자비보다 자기보호를 선택했다. 그 회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좁히고, 스스로 지은 감옥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 감옥의 이름은 ‘정당성’이었다.
거기서 그는 견뎌낸 고생만을 헤아렸고, 이미 받은 은혜는 잊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 주셨건만, 니느웨가 받은 자비는 오히려 허무였다. 그것은 그의 수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내가 옳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 선택은 당연했어.”
그 속엔 고생의 자랑과 희생의 계산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고 오래 버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침묵해야 한다.
요나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해도, 그 지식은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욘 4:3)며 절망의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내려갔다. 숨이 막히고, 빛 한 줄기 스미지 않는 어둠이 몸을 감쌌다.
그의 ‘알았다’는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오래 쌓인 고생과 희생을 되짚는, 골짜기처럼 움푹 패인 자기연민의 고백이었다. 말끝마다 굳은 표정이 그림자처럼 번졌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신실함만 헤아렸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보지 못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니느웨가 심판을 면한 것도 모두 그 자비 덕분이었지만, 그 은혜 앞에서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견뎌낸 고생의 끝은 공허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야 끝 너머로 밀려나 있었고, 그는 두 손 가득 자기 정당성만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마저 자기 기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묶여 있었다.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쥔 지식과 입 밖에 낸 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 자유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의 분노는 이 짧은 한마디에 응축됐다. 그 안엔 고생의 무게만 남았고, 은혜는 사라졌다. 헌신의 기억은 남았으나, 용서의 기억은 사라졌다.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신실함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난 요나는, 먼 길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같았다. 그러나 니느웨가 용서받는 순간, 그는 다시 집 밖에 서 있는 큰 형이 되었다.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용서받아야 하지?” 그의 눈빛에는 누가복음 15장의 큰 형이 지녔던 서늘한 질투가 번졌다. “나는 늘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그는 잔치로 맞이받는가?”(눅 15:29-30)
요나도, 형도 은혜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정의라는 성벽 위에 서서 은혜를 비난했고, 발밑에는 집 안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지만, 끝내 그 길을 밟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아끼는 것을 네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욘 4:11) 그 물음은 날 선 꾸짖음이 아니라, 열린 대문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럽고 환한 초대였다.
니느웨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것을 보고 화를 낸 내가 요나라면 — 잔치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큰 형이 나라면 —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나는 다시 탕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서진 이를 끌어안는 은혜의 품으로. 그 품이야말로 우리가 마침내 서야 할 자리다.
어릴 적 고아원은 배고픔이 일상이었다. 정부미보다 더 거친 쌀조차 없어 허기를 삼키던 날들. 빨간 다라이에 담겨 호실별로 나눠오던 밥은 언제나 모자랐다.
맨 뒷방엔 ‘약장’이라 불린 금지된 문이 있었다. 그 안엔 반짝이는 포장과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손에 닿는 일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다. 형들은 몸집이 작은 아이들을 시켜 거기를 들어가게 했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나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늘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꼽추 김득수와 함께였다. 몸집보다 큰 가방을 들고 약장의 작은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은 열린 동굴 같았다. 반짝이는 포장들이 별빛처럼 쏟아졌고, 달콤한 냄새가 숨결에 스며들었다. 들뜬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채웠다.
그러다 들켰다. 고아원 선생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매를 맞았다. 그러나 매보다 깊게 남은 것은 들킨 순간의 얼어붙은 당혹감이었다. 사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은 선명하다.
그전까지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곳에 온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자기연민은 익숙한 방패였다. 그러나 약장에서 훔친 것을 들킨 순간, 그 방패는 산산이 부서졌다.
다섯 살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길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 꿈은 환난의 바닥에서 나를 붙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지었다. 그리고 그 요새 같던 내 정당함의 성벽이 처음 무너진 날, 바로 그날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다행이었다. 정당성을 내려놓는 법을, 나는 그날 처음 배웠다.
십자가, 정당성을 내려놓는 자리
왜 나는 끝까지 옳아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럴 수 있는 방법도, 말도, 우리에게는 없다.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끝도 없고 깊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뿐이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참으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 세상 그 무엇도 신실하지 않다. 나는 내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옳으시다는 사실을 붙든다.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의 자리 —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 로 되돌리신다. 그 자리만이 내가 설 수 있는 참된 정당함의 자리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옳다 말할 수 없다. 그곳은 하나님조차 아들을 내려놓으신 자리다. 모든 변명은 그 빛 앞에서 가루처럼 흩어지고,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나는 옳지 않았다." 짧은 고백에서 은혜는 싹튼다. 십자가는 응답한다. "너는 옳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낀다." 그 음성이 피처럼 스며들면, 사람은 방패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자주 제자리로 돌아가고, 쉽게 부서진다. 그러나 그 부서짐을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의 품, 곧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신다. 그곳은 모든 변명과 자존이 벗겨지고 사랑만이 남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다. 논리도, 신념도 아닌,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정당하게 한다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끝까지 옳으시다는 것을.
십자가는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도 그분은 말없이, 그러나 깊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속에서 깨닫는다. 진정한 옳음은 내가 움켜쥔 논리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은 우리의 추락도, 도망도, 억울함도 품어 안으신다. 우리가 피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오래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옳음이 부서진 자리
조원태
피는 꽃이
지는 꽃을 품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안듯
저무는 해가
바다를 감싸듯
흐르는 강이
바위를 품듯
내 옳음이
내 그릇됨을 만나
익어간다
각주) [1]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현실이 충돌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줄이려는 경향을 설명하며, 이를 '인지 부조화'라 명명했다.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pp. 3–15.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을 설득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뒤 "투자라고 생각하면 괜찮아"라며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심리 과정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2] Jack M. Sasson,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The Anchor Bible, Vol. 24B), New York: Doubleday, 1990, pp. 311–313. 잭 새슨은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을 고발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본래 위로를 전하는 선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입술에서는 항의의 언어로 변했다고 지적한다. Cf. Phyllis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pp. 199–204. 트리블은 요나 4:2-3의 기도가 구조적으로 ‘책망–정당화–동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럴 줄 알았다’(ki yada‘ti ki)라는 반복적 어휘와 자주 등장하는 1인칭 대명사(‘나’, ‘내’)가 요나의 자아 중심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의 자비 선언을 본래의 위로가 아닌 항의의 근거로 전환시키며, 본문 중심에 자리한 하나님의 성품 고백을 아이러니하게 무너뜨린다.
[3] Timothy Keller, The Prodigal Prophet: Jonah and the Mystery of God's Mercy, New York: Viking, 2018, pp. 105–107. 켈러는 성경을 읽으며 자기 의를 강화하려는 태도가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왜곡한다고 지적하며, 성경은 우리를 낮추고 비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할 때 올바르게 읽힌다고 강조한다.
[4]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억압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데 쓰였던 장면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에 관한 심층적 고찰은 포스트콜로니얼 성서비평, 역사신학, 인권사 연구서 등에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R.S. Sugirtharajah, Postcolonial Critic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Musa W. Dube,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Gerald West, The Stolen Bible, 김회권 외,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성경이 해방의 언어가 아닌 지배의 도구로 오용된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경고와 성찰의 거울이 된다.
[5] Jacques Ellul, The Judgment of Jonah, Grand Rapids: Eerdmans, 1971, p. 74.
[6] Gerald L. Clore, Norbert Schwarz, and Michael Conway, "Affectiv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ed. Robert S. Wyer and Thomas K. Srull (Hillsdale, NJ: Erlbaum, 1994), pp. 323–350. 이 논문은 감정이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 미치는 원인과 결과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감정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7] Jacques Ellul, The Judgment of Jonah,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71), 76.
[8]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현대인의 자아가 내면의 도덕 감각과 자기 정당화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타자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립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예언과 체면에 갇히는 태도와 유사하다. —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3–4.
[9]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인간 이해의 본질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은 타자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계적 자아 이해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실패한 지점이기도 하다.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3.
[10]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Johann Heinrich Arnold)는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해체 위기를 겪던 시기, 계단 아래에서 홀로 울며 깊은 내면의 붕괴를 경험했다. 그를 가장 매몰차게 비난했던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하며 그가 깊이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퍼부었고, 다른 이들은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떠나며 가구와 물품을 챙기고, 집 안에 있던 땔감까지 가져갔다. 공동체에 남은 가족은 일곱뿐이었다. 아놀드는 이때를 "파탄이었다"고 고백했다. — 피터 맘슨(Peter Mommsen), 『부서진 사람: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 하인리히 아놀드의 생애』, 칸앤페리 옮김 (서울: 바람이불어오는곳, 2022), 71–73쪽.
- 이전글왜 다시 제자리인가? (요나 4:1) 25.08.23
- 다음글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요나 3:1-10) 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