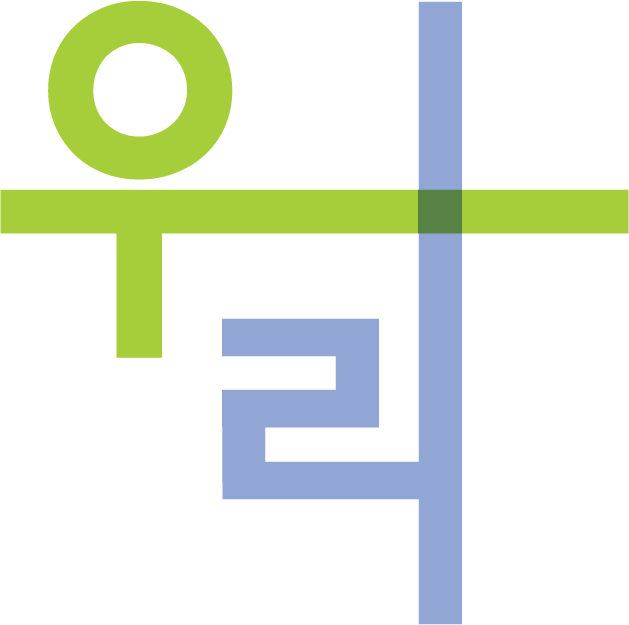연재글 왜 사는가? (요나 2:10)
페이지 정보

본문
요나서로 묻는 17개의 질문
왜 사는가? (요나 2: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1]
모래 위에 쓰인 질문
모래 위로 파도가 밀려든다. 지워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들, 그게 그 질문의 모양이다. 삶이 한 줄씩 다시 써 내려지는 그 모래 위에, 물음 하나가 남는다.
왜 사는가
해가 막 떠오른 해변처럼, 대답은 멀리 있었고 삶은 젖은 채 기다렸다.
요나는 다시 육지에 서 있었다. 사흘 밤, 어둠의 뱃속을 지나 도달한 빛이었다. 모래 위에서 제 발로 서는 일, 신비다. 손끝에는 아직 짠물이, 옷자락에는 비린내가 들러붙어 있다.
바다는 등 뒤에서 속삭이고 있다. 바다는 삶의 물음을 품었고, 육지는 그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질문은 파도처럼 반복되고, 그 물음은 삶의 등을 떠밀었다.
요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표적이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이 아니라 여정으로 증언된 복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판을 새기신다. 잉크는 말씀이고, 우리는 눌려 찍힌 생의 흔적이다.
모래 위에 남겨진 질문—왜 사는가. 그 물음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결코 같은 자리에 닿지 않는다. 이전의 대답을 지우고, 새 문장을 요청하듯.
하나님의 숨결이 스치면, 질문은 다시 숨을 쉰다. 삶은 마치 닳지 않는 판화처럼, 말씀은 오래된 인쇄판처럼 우리를 눌러 새긴다. 잊힌 자리에 다시 흔적을 남기며, 일으켜 세운다. 왜 사는가—그 물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자리에서 태어났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은 물고기를 먼저 떠올린다. 어둠 속 요나를 삼키고, 다시 뱉어낸 그 극적인 장면. 하지만 그건 겉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요나 2:10), 단 하나의 말씀이 깊은 바다를 가르고 생명을 끌어올렸다. 기적은 눈부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한다. 하지만 기적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기적을 향한 허기를 남긴다.
그러나 성경은 묻는다. 정말 기적이 먼저였느냐고. 아니다. 기적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적을 움직인다고. 말씀은 물고기의 방향을 틀게 하고, 요나의 생사를 갈랐다.
모세 시대의 기적도 마술로 흉내낼 수 있었지만, 말씀은 흉내낼 수 없다. 기적은 감탄을 자아냈지만,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다. 진짜 힘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 기적은 겉을 뒤흔들고 말씀은 속을 두드린다.
니체는 말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자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2] 삶의 의미가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다. 기적은 눈을 열지만, 말씀은 가슴을 붙든다. 삶은 말씀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 12:39). 요나는 말보다 걸음으로, 기적보다 말씀으로 증언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면, 삶 전체를 다시 쓰기에 충분하다는 선언이었다.[3]
나는 지금 분단의 최북단, 철원에 머물고 있다. 국경선평화학교[4]에서 지내며, 그 평화의 경계에서 삶을 다시 묻는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이곳으로 오실 거라 믿는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스며드는 저녁, 나는 정지석 목사의 뒷모습을 따라 소이산의 오솔길을 걸었다. 국경선평화학교의 이름처럼, 그 길은 경계였고, 기도였다. 열세 해 동안 북녘을 향해 기도한 그의 발자국이 눅진하게 남은 길이었다. 그는 단 하루도 그 방향을 잊지 않았다. 그의 등은 바람을 가르며 북쪽을 향했고, 발끝은 늘 한 자리를 지켰다.
그의 삶은 땅 위에 새겨진 복음. 글자가 아니라 걸음으로 새겨졌다. 말씀이 종이에 쓰이지 않고 사람의 몸에 새겨진다면, 그것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뒷모습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배웠다.
그 곁에는 '하루'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었다. 내가 앞서 걷고, 이름을 불러도 '하루'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손에서 삶은 계란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뒤에 있는 주인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는 뒤에서 불어오는 주인의 숨소리에 머물러 있었다. 본능처럼, 그는 진짜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하루’의 소리 없는 시선은 나를 멈추게 했다.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나를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은 누구의 숨결에 반응하고 있는가.
어제, 동생이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왔다. 그 얇은 선 너머에서 기적처럼 되돌아왔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은 어떤 음성을 따라 걷고 있는가.
말씀은 어둠 속 요나를 육지로 밀어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문을 두드린다. 기적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남는다.
욕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질 때,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 모두는 한때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을 지나왔다.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분단의 비무장지대는, 마치 삼켜진 바다의 깊이처럼 침묵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철조망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쉼 없이 숨 쉬고 있다. 바람처럼 스며들고, 흙처럼 남아 있는 말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땅을 토해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살아 있는 이유다.
요나를 토해낸 건 기적이었다. 그러나 더 깊은 기적은, 생명의 방향을 바꾼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을 밀어 올린다. 기적이 아닌 말씀이, 생명을 다시 걷게 한다.
다시스로 도망치던 순간에도, 깊은 물속에서도, 니느웨 거리에서도—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를 끝내 놓치지 않으셨다.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 숨었어도 따라오는 숨결. 그 말씀이 요나를 살렸고, 니느웨를 일으켰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 살아 움직인다.
왜 사는가. 의미는 곧 생존의 숨구멍이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도, 사랑 하나만 떠올릴 수 있다면 인간은 버틸 수 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새벽 같은 선물이다. 쓰러진 자리에 말씀이 내려앉고, 밤이 물러난 틈으로 한 줄의 말씀이 스며든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킨다. 다시, 걸어 나가게 한다. 삶은 거기서 시작된다.
몸으로 새긴 복음
요나는 말을 줄이고, 몸으로 말했다. 뒷걸음치던 발끝, 바다에 던져지던 순간, 사흘 동안 어둠을 버티던 몸, 그리고 다시 땅 위에 던져진 그 시간이 곧 복음이었다.
요나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길을 걸었고, 버텼고, 자기 몫의 시간을 견디며 삶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의 몸은 하나의 문장이었다. 굽은 어깨와 젖은 옷자락, 그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었다.[5]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를 떠올렸다. 산 위로 돌을 밀어올리는 반복이 삶이라면, 우리는 그 무의미 속에서도 의미를 끌어올려야 한다고.[6] 요나의 몸짓은 그런 의미의 반복이었다. 끝없이 밀려나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물결처럼.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은 요나를 ‘표적’이라 부르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의 여정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그려낸 삶의 복선이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40). 말이 아니라 육신으로 새긴 복음. 하나의 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 요나서는 그 몸이 말한 예언서였다. 예수님은 말씀을 입이 아닌 몸으로 옮기셨다. 죽음과 부활—그 두 개의 몸짓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표적이어야 한다. 아무 말 없이 견디는 하루가, 말없이 건너는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면.
왜 사는가.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누군가의 부활을 준비하는 십자가다. 말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몸으로 새긴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나는 몸으로 복음을 새긴 사람이었다. 물고기에 삼켜졌던 시간, 육지에 다시 내던져진 그 순간까지—그의 삶은 임마누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의 긴 문장이었다.
요나는 왜 살아났는가. 사랑 없이 니느웨로 향하지 못했던 그가, 다시 육지에 선 것은 하나님의 밀어내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갈망한다. 눈부시게 한순간을 바꾸는 외부의 힘을. 그러나 진짜 기적은 사랑이다. 미움의 벽을 넘고, 무너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은밀한 능력.
요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 걸었다. 물고기 뱃속의 깊이를 지나며,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시를 향해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고. (마 12:39)
요나는 사랑으로 살아났다. 그 사랑은 부활의 능력이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킨다.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임마누엘의 사랑이 다시 걷게 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나를 삼킨 어둠이 다시 나를 토해낼 것을. 병에서, 상처에서, 죄에서, 배신에서, 분단에서—모든 절망의 바다에서 밀려나와,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가, 내 부활의 육지가 될 것이다.
성령이 찍어낸 삶의 흔적
기적은 충분했을까. 요나가 육지에 던져진 그 순간을 생각한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면, 그건 눈앞의 장면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을 일으킨 말씀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경비병들과 공회원들. 시간도, 거리도, 정보도 모자라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달랐을까. 눈으로 본다고 모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진리를 가슴에 품었어야 했다. 그러나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떨림으로 다가온다. 깊은 심연에서 문득 올라오는 그 진동이 성령의 숨결일 때, 기적은 비로소 살아 있는 생명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진짜 삶이 되었던 건, 성령이 그들 안에 숨처럼 불어왔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덤이 열리는 장면보다 더 깊은 울림. 말이 아니라, 숨결 같은 바람이 그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성령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말은 한 생명이 다시 땅 위에 놓였다는 뜻만은 아니었다. 성령의 빛이 그 육지를 비추었고, 어둠에서 다시 걸어야 할 이를 등 떠밀었다. 부활은 눈부신 장면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게 하는 속삭임이었다.
요나가 선 그 땅은 살아남은 자의 땅이 아니었다. 다시 살아야 할 자의 자리였다. 그에게 들린 한마디, “일어나라”—그건 명령이자 초대였다. 끝났다고 여겼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여정이다.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음이 여전히 나를 흔들기 때문에 걷는다. 살아 있다는 건,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성령의 빛 아래 삶을 다시 묻는 순간, 부활은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견뎌낸 어제와 포기하지 않은 오늘은 성령이 새긴 부활의 흔적이다.
왜 사는가.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시 뱉어낸 땅 위에서, 우리는 도망을 멈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끝을 끌어당기고, 임마누엘의 사랑이 심장을 밀어 올린다. 어제는 침묵이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바로 여기, 다시 살아야 할 육지다.
요나의 표적은 내 삶에 깊은 판을 새긴다. 그 판화는 내 주변의 니느웨에도 수없이 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났다.
왜 사는가—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이유다.
삶은 말씀에 응답하는 걷기다. 부활은 눈부신 순간이 아니라, 매일 새겨질 삶의 흔적이다.
살아 있다는 건
조원태
물고기 뱃속
하루를 더 넘긴다는 건
기적이었다
숨이 끊긴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밀어냈다
사랑은 기적보다
느리지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
각주) [1] 이슬람 경전 『코란』은 요나를 '유누스(يونس)'라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록한다(코란 37장 139-146절). 요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경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그의 삶은 심판과 자비,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2] Friedrich Nietzsche, Twilight of the Idols, trans. R. J. Hollingdale, London: Penguin, 1990, p.33. As quoted in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trans. Ilse Lasch, Boston: Beacon Press, 2006, p.104.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almost any how.” (삶의 이유를 아는 자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 이 문장은 니체의 저작 『우상의 황혼(Götzen-Dämmerung)』 중 ‘격언과 화살들’ 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핵심 주제로 재인용되었다.
[3] Jack M. Sasson,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Anchor Bible Vol. 24B (New York: Doubleday, 1990), 8–14, 174–177. 요나서를 ‘신학적 교육 드라마’로 해석하며, 예언자의 설교보다 그의 몸짓과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신학적 메시지에 주목한다. 특히 요나 2:10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기적보다 말씀의 주권과 생명을 이끄는 능력을 강조한다.
[4] 국경선평화학교는 '평화통일이 곧 온전한 독립'이라는 뜻을 품고 2013년 3.1절에 설립되었다. 분단의 상징인 DMZ 현장에서,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가능성 사이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를 위해 생애를 거는 사람(Peacemaker)’이 되도록 교육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eaceschool.or.kr
[5] 소예언서 중 유일하게 이야기 구조를 따라 전개되며, 예언자의 설교보다 그의 삶의 여정에 집중한다. 기원전 4세기경, 유대인들은 이 책을 예언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였다. 요나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언했기 때문이다. 물고기 뱃속의 침묵과 육지 위의 걸음이,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처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마 12:40, 눅 11:30).
[6]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옮김, 책세상, 2000, p.23.
- 이전글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요나 3:1-10) 25.08.23
- 다음글왜 은혜인가? (요나 2:2-9) 25.08.23